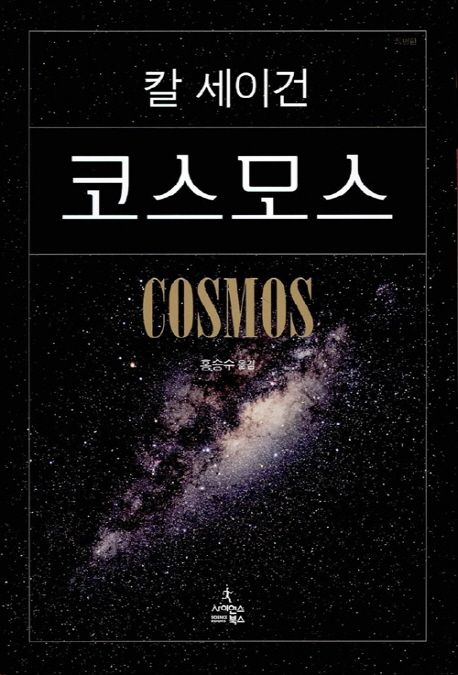
오랜만에 다시 펴보는 <코스모스>다. 처음 읽을 때에는 과학서적 같지 않은 느낌에 조금 지겹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두 번째 만난 이 책은 너무 아름답다. 읽는 내내 칼 세이건이 설렘이 느껴져서 나도 함께 꿈을 꾸게 되는 듯한 기분이다. 구절구절이 너무 낭만적이다. 과학이라고 보다는 과학과의 로맨스라고 불어야 할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집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돈다. 그는 목숨 이상으로 과학을 사랑했나 보다.
<코스모스>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우주에 관한 얘긴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런 면에서 천문학의 이야기가 궁금해 책을 펼친 사람에게는 인문학적 지루함이 덮치게 될 것이고 과알못들에게는 펼칠 용기조차 주질 않는다. 무려 700페이지라는 장벽도 무시할 수 없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조화', '질서'라고 불러야 맞다. 인간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모두 '신'이라는 존재에 돌려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은 자연의 사사로운 것마저 신이 관장할 수 없을 거라 믿고 자연의 법칙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조화로움. 그것은 지구에도 있고 태양계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다. 그런 욕망의 결실이 바로 과학이다.
비과학은 자주 과학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도 천문학 책이 팔리는 수보다 별자리 점 책이 더 많이 팔릴 거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 퍼져 나간다. 가톨릭은 과학을 천 년 가까이 방해했다.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1300년 전에 이미 나왔다. 미적분의 개념도 뉴튼보다 훨씬 전에 존재했다. 비과학이 과학을 말살하는 통에 인간의 발전은 더뎠다. 그래도 과학의 흐름을 막을 순 없다. 과학이야 말로 인간의 본능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칼 세이건은 비과학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비과학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과학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껏 과학은 기득권을 위해 존재했었다.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 불균형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기득권은 더 고등 교육을 받고 또 기득권을 차지한다. 기득권을 유지했던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비과학이기도 했다. 종교와 미신은 그 중심에 있다. 왕권이 신권이라는 믿음도 그렇다. 하지만 과학은 다양성이 인정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을 때 급속도로 발달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비과학의 영향을 줄여야 하고 기득권이 차지한 지식을 퍼트려야 한다. 그것이 그가 비과학과 싸우는 이유기도 했다.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연구하는 것과 같고 외계인을 찾는 것은 인간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간을 이루는 물질은 모두 우주 속에서 생겨난 것이고 모든 생물은 초신성의 자손들이라고 해도 될 만큼 별의 폭발과 연관되어 있다. 무엇보다 생명의 순환과 별의 순환이 다르지 않다. 우주에 흩어져 있는 역사를 채집하는 것은 우리를 좀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드넓은 우주에서 생기는 고등 생명체는 아직까지는 유일한 생명체다. 우주의 티끌만큼도 되질 않는 존재이면서도 가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의 존재를 너무 과대 평가할 것도 없고 너무 초라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여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든 인간의 의지든 우리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
철학적인 문장의 인용으로 챕터를 시작하며 충분히 많은 과학적 지식 위에 철학적 질문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 올려져 있다. 걱정스러운 부분도 설레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저자의 즐거움이 묻어 있다. 첫 번째 읽을 때에는 느껴지지 않던 그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덩달아 지겨울 새도 없이 책을 덮었다.
점점 더 커져가는 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 지구 공동체가 되기를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게 되었다.
'독서 (서평+독후감) > 과학 | 예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평) 사실은 이것도 디자인입니다 (김성연) - 한빛미디어 (0) | 2023.09.04 |
|---|---|
| 코스모스 : 가능한 세계들 (앤 드루얀) - 사이언스북스 (0) | 2023.08.23 |
|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 을유문화사 (0) | 2023.07.29 |
| (서평) 고양이와 물리학 (블라트코 베드럴) - RHK (0) | 2023.06.09 |
| (서평) 90일 밤의 우주 (김명진 외 7인) - 동양북스 (0) | 2023.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