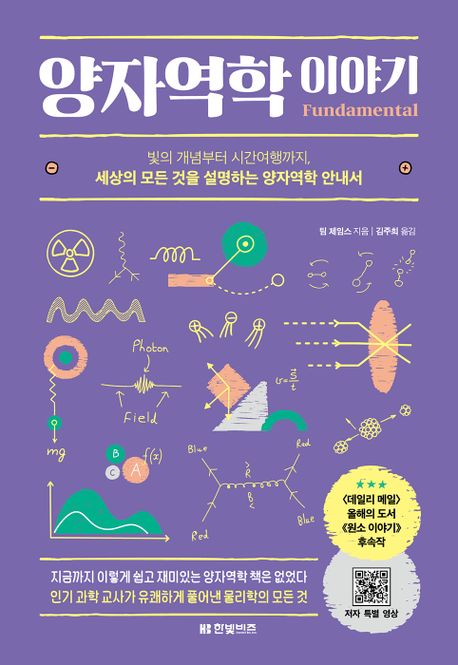
양자역학은 최근 과학을 이끌어 갈 만큼 트렌디하다. 각종 SF소설에서도 이를 차용하여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어려울 것 같기만 했던 양자역학이 친숙하게 다가오기까지 한다. 그중에서도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이 좀비 고양이는 양자역학의 한 부분이면서도 이전 양자역학의 '중첩'을 반론하기 위한 예였다. 그래서 조금 까탈스럽게 나누자면 슈뢰딩거부터 양자역학이라 얘기하고 그 전의 이론은 양자학이라고 부른다.
세상의 규칙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듯한 양자역학의 긴 역사를 한빛비즈의 지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양자역학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된다. 빛은 인간이 오랜 시간 연구해 오고 있는 대상이 기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 물질이기도 하다.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의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논의는 결국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다는 애매모호한 결과로 갈무리된다. 이것이 아마 양자역학의 시작이었는지 모른다. 이중 슬릿 구조를 이용한 발견은 하이젠베르크에 이뤄 모든 상태는 중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하지만 슈뢰딩거는 파동 방정식으로 이를 반박했고 '양자 얽힘'이 대세가 된 것 같다.
아인슈타인은 누구보다 양자역학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확률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연으로 거대한 법칙으로 동작한다는 그의 신념에 반하기 때문이었을 거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끝까지 방정식으로 그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그의 위치는 다소 초라해 보이기도 한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입자들이 발견되고 중성자, 양성자, 전하, 양전하를 비롯해서 미립자, 중성미자, 쿼크 등이 등장하면서 양자역학은 점점 체계화되고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넘어야 할 산은 그 자체에 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라며 얼버무리며 넘길 순 없다. 관측되지 않는 이론은 언제까지 이론일 뿐이다.
세상을 이루는 많은 물질이 이 작은 것들에 위해 유지되는 것이 신기하다. 이 조그마한 세계의 결합이 얼마나 강하길래 우리 몸은 이렇게 형체를 잘 유지하고 있을지 신기하다. 우리 삶 그리고 우주가 이 작은 입자와 필드의 상호 작용으로 이뤄진다. 우리는 이제 이런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를 갖추었을 뿐이다. 여전히 양자 이론이 나가야 할 길은 멀다.
이 책은 양자역학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발표되었던 이론들을 역사 순이 아니라 맥락에 맞춰 이어 나간다. 그래서 마지막엔 연도 표를 따로 추가해서 두었다. 재미나게 그린 손그림과 위트 섞인 말투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양자 이론들 속에서 여유를 찾게 해 주었다. 하지만 어려운 학문인만큼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린지..' 하는 순간을 자주 만나긴 하는 것도 사실이다.
내용의 난이도를 떠나서 읽히기는 것은 잘 읽힌다. 주인공이 계속 바뀌며 스토리만 나아가는 어쩌면 양자 자체가 주인공인 그런 소설일까? 양자역학의 긴 시간을 가볍게 훑어야 한다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다.
'독서 (서평+독후감) > 과학 | 예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평) 인간이 만든 물질, 물질이 만든 인간 (아이니사 라미레즈) - 김영사 (0) | 2022.12.18 |
|---|---|
| (서평) 나는 사이보그가 되기로 했다 (피터 스콧 모건) - 김영사 (0) | 2022.12.12 |
| (서평) 어메이징 그림자 아트 (빈센트 발) - 팩토리나인 (2) | 2022.11.25 |
| (서평) 침묵의 지구 (데이브 굴슨) - 까치 (0) | 2022.11.11 |
| (서평) 지구물리학 (윌리엄 로리) - 김영사 (2) | 2022.11.07 |